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3년 5월 3일
36. 그들이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성공의 역사
Amazing everyday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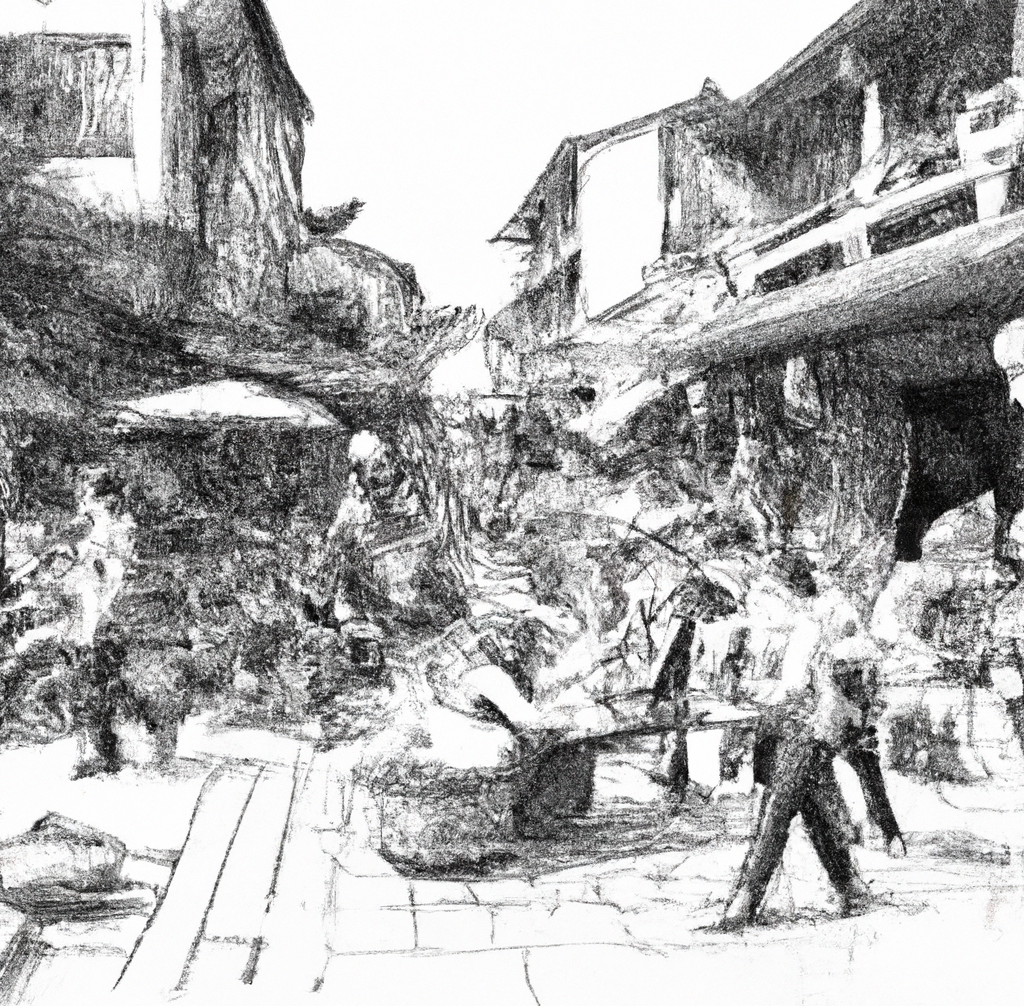
“우리 중국인들은 제왕장상帝王將相의 정치사, 영웅의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대일통大一統을 완수하고 영토를 넓혀 중화민족의 위업을 떨쳤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기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소위 영웅의 통치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란과 우환속에 목숨과 재산을 잃고 희생당했습니다.”
마카우대학의 저명한 미시사 학자인 왕디王笛교수는 그의 저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야말로 놀라운 성공의 역사 碌碌有為>>(여기서 녹록무위碌碌無為는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한 삶의 무의미함을 뜻하는 사자성어)에서 당송唐宋시기부터 신중국설립 직전인 근대민국시기까지 중국 사회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놓는다. 총 14장으로 이뤄진 이 저작은 중국의 인구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와 제도, 종교, 사회구조, 생활양식과 풍속, 공간과 산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사실 그의 주요한 관심사는 중국의 전통사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간사회와 자치의 역사이다. 중국에서는 비록 서구와 같은 시민사회나 시민의 정치참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의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적이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민간의 중국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탐구한다.
왕디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의 역사연구 주제는 자기 고향의 사회사이다. 그중에서도 청두의 도시문화, 특히 청두시민들이 즐겨찾던 공공공간과 차관茶館의 역사, 이 공간의 주역들에 대한 사연을 깊이 탐구했다. 마치 유럽의 도시와 이 도시를 발전시킨 지식인과 상인들, 이들의 회합장소인 살롱이나 커피하우스가 서구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책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영역을 가장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챕터는 “시장에서 도시까지”이고,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민간과 자치영역의 요소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들의 구조, 형성의 역사, 이 공간을 채우고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그룹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시장과 상인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는 성시城市인데 성城은 도시를 둘러싼 경계로서의 성벽, 시市는 도시안의 교역장소인 시장을 일컫는다. 초급시장을 뜻하는 글자는 지역별로 북방의 집集, 남방의 허墟, 그리고 서남쪽의 장場이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옛지명의 유래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존재덕에 농촌지역의 군락집거지인 작은 성진城鎮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성진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중국에서 “소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시장은 단순히 거래가 일어나는 상업공간일뿐 아니라 농민들의 사교공간이자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해듣는 뉴스스탠드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장에는 대개 이들이 회합하는 차관과 주점이 있었다. 농민들은 집에 돌아와 가족 성원들에게 여기서 들은 소식을 전했다. 전통시대에는 평범한 농민들이 바깥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규모가 큰 도매시장들은 대개 중국의 하급지방정부인 현縣이나 상급지방정부인 부府가 위치한 곳에 소재했고, 이곳의 차관에서는 지방의 관리, 큰 상인들, 지역의 향신들이 회합을 갖고 지역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에서 상인들의 역할은 오랜 기간 춘추春秋시대 관중이 이야기한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정해진 위계에 따라 결정됐고, 정치적으로는 농민보다도 발언권이 적었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상업이 매우 발달한 명청明清시기이다. 지역에서 향신鄉紳이라 불리는 신사士紳계급, 즉 지식인, 지주와 상인들이 통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상인들은 자식에게 글공부를 시켜서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거나 신사계급으로 편입되기를 원했고, 신사계급에서도 관료가 되지 못한다면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특히, 남방의 여러 상인 가문들은 친족 네트워크안에서 상업네트워크를 키워 나갔다. 가문은 토지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에서 상업과 산업자본도 축적한 것이다. 이런 상인과 신사계급의 통합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대자본이 형성되고 기술과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되기도 한다. <<차이나 붐>>의 저자 흥호펑의 설명이다. 그는 상인들이 자기 자식들이 관료가 되기를 원했고, 일단 관료가 되면 상업을 통해서 계속 재산을 불려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세습되면서 경제적 실력이 커지는 자본가 계급은 중국 전통사회에서 생겨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상인의 자식이 상인이 되어 대를 잇는 경우는 20세기인 민국民國시대에야 등장했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통은 이어지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동남아시아등의 화교세습자본에서는 이런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헐리웃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묘사되는 싱가폴의 부동산재벌 가문이 그 사례이다.
상인들중에서 글공부를 가장 중시한 집단은 안휘安徽성지역의 휘상徽商들이다. 이들은 주희朱熹를 특히 숭상했는데 주희의 별칭인 자양紫陽이라는 이름을 딴 자양서당을 자신들의 상업세력권 지역에 많이 세웠다고 한다. 주로 장강하류에서 소금을 거래한 휘상들은 한때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점차 지식인 계급으로 전환된다. 명청시기의 유명한 상인집단은 이밖에도 샨시山西성지역의 진상晉商, 광둥廣東의 월상粵商, 푸졘福建의 민상閩商, 그리고 져장浙江성 지역의 절상浙商이 존재한다.
연안지역에서 기원한 다른 상인들과 달리 유일한 내륙상인인 진상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했다. 중국의 남방에 내려가 차를 사서 북으로 돌아가서 러시아 상인에게 차를 팔고 모피를 사들였다. 이렇게 남북으로 물건을 운송하는데 일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진상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정부가 특혜를 주기도 했다. 중국의 과거제도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차시험인 현시縣試, 2차시험인 향시鄉試는 자기의 출생지역에서 치루고, 마지막 3차시험인 회시會試는 수도에 모여 황제앞에서 치루게 된다. 그런데 진상의 자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어떤 지역에서든 1, 2차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장기간 먼거리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를 고용해야 했다. 이들을 표국鏢局이라고 부른다. 표국에 속한 표사鏢師는 무예에 능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강호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슬랭을 구사할 수 있어야 했다.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협상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진상은 나중에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래지역에서 표호票號라 불리는 사설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표호가 융성하면서 표국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좌절된 근대
원래 중국의 민간에서 생겨난 사설은행은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전장錢莊인데 중국에서 사용되는 두 종류의 화폐인 백은과 동전을 교환해주는 기능을 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액의 단위로 백은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나친 고액권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은을 동전으로 바꿔야 했다. 두번째가 진상들의 표호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결제를 위해서 백은을 짐속에 감춰서 먼 여행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됐고, 그래서 표국을 고용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표호라는 일종의 여행자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이제 백은대신에 표호를 몸에 지니고 가서 해당 거래 장소에서 백은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여행노정에서 백은을 노린 도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됐다. 전장이나 표호는 이렇게 백은과 동전등의 화폐교환과 보관의 기능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출과 저축기관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농민을 비롯한 보통사람들도 잉여화폐가 생기면 이들 민간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이자를 받고 싶어했다. 그래서 진상들의 업무영역은 자연스럽게 무역거래에서 금융업으로 확장됐다.중국의 민간은행 표호는 나중에 개항이 되면서 훨씬 더 큰 자본을 가진 서구의 은행에 밀려나게 된다. 서구인들이 만든 무역업체인 양행洋行은 초기에는 청나라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무역항인 광저우廣州에 들어섰고, 아편전쟁이후에는 중국 연안의 각 통상개항지역들 특히 상하이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된다. 광저우에는 원래 13행行이라 불리는 청나라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국내무역업체들이 있었다. 광저우는 이미 당唐나라시기인 9세기부터 중국의 무역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때, 광저우에 거주하던 페르시아, 아랍 등지에서 온 상인들의 숫자가 무려 10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월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남송南宋시대에 무역항의 중심지는 한때, 푸졘성의 촨저우泉州, 푸저우福州로 넘어간다. 이들이 민상의 시초이다. 푸졘성은 산지가 많고 차재배로 유명했기 때문에 민상의 거래 기반은 차상품이 많다. 그밖에 져장성의 닝보寧波지역도 무역항으로 유명했다. 여기에서 나온 이들이 절강상인이다. 이곳은 상업이 무척 발전했기 때문에 20세기초 닝보의 30만명 인구중 상인의 비율이 60%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의 건륭乾隆제는 모든 무역항을 문닫게 만들고 유일하게 광저우만을 남겨뒀다. 그래서 13행의 중국 상인들은 당시 세계최고의 갑부였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납부했고, 그래서 동시에 정부가 수여한 명예관직도 지니고 있었다.
아편전쟁에 패한 후 개항이 이뤄지고 13행은 쇠락하게 됐으며, 광둥성의 무역중심지는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옮겨진다. 과거 13행에 고용됐던 직원들은 양행의 대리상과 중개인 역할로 나섰는데 이들이 바로 소위 매판買辦상인들이다. 그들은 양행의 자본을 기반으로 수출입품을 거래하는 무역업, 운수업,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의 거대 민간은행중 한곳인 초상招商은행의 모기업 초상국招商局는 원래 운수기업이고 이들 매판상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현대 중국에서 매판이란 표현은 중립적으로 사용된다. 오히려 매판상의 경험을 통해서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중국기업과 자본을 키워나가는 토대로 삼거나 교육사업에 힘써 존경을 받는 선각자들도 많이 나왔다.
청말민초清末民初에 실업구국實業救國이란 구호적 표현이 있었는데 기업활동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자는 뜻이다. 대표적인 상인의 한명이 장수江蘇성 난퉁南通의 장졘張謇이다. 장졘은 1894년 청나라의 마지막 장원급제자였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무려 30여년을 수험생으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 패한 후 속절없이 무너지는 중국의 현실에 낙담해서 관직에 오르지 않고 고향인 난퉁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학교와 기업, 그리고 복리시설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었다. 난퉁은 상하이에 인접한 지역인데, 장강 하구언의 삼각주와 가깝다. 여기서 농민을 독려해 땅을 간척하고 원래 이 지역에 발달해있던 방직업을 일으키기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중국학계에서 인류학과 사회학의 비조로 존경받는 페이샤오퉁費孝通의 집안은 원래 장졘과 가까왔고, 그 역시 장쑤성의 향신출신이다. 페이샤오퉁의 이름에서 퉁은 쟝젠의 고향인 난퉁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의 대표작인 <<강촌경제>>에서 그는 중국의 농민들이 농업과 수공업을 겸해서 생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중국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페이샤오퉁뿐만 아니라 신중국설립 이전에 많은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이 남긴 민족지 기록은 농민들의 경제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소작농이든 자영농이든 농사를 지은 식량과 채소 등은 모두 가족성원들의 자급자족에 사용됐다. 잉여 현금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수공업과 상업을 겸하거나 자영농의 경우 농사의 절반은 면화와 같은 경제작물을 재배해야 했다. 소작농은 이런 겸업을 통해 입에 풀칠을 했고, 자영농은 치부를 하기 위해서 농업외의 별도 수입이 필요했다. 가장 발달한 수공업도 면방직업이었다.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보통 노동자의 수년간의 노동수입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현금수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의 결혼이 매우 늦어졌다. 자영농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자기 생계에 필요한 수입정도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을 꾸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구에서 기계를 도입해 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생산하거나 기계로 생산된 면직물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의 수공업기반이 잠식되고 농촌경제는 갈수록 쇠락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지속되지 못한 더욱 결정적인 요인은 내전과 일본의 침략전쟁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쓰촨성같은 내륙지역의 전통 방직업이 온존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남방에 특히 많이 남아있던 중국의 향신계급은 가문을 중심으로 학교를 많이 세웠다. 특히 가문의 사당들이 학교의 인프라로 사용됐고, 다른 성씨의 자제들에게도 학교가 개방됐다. 이 학교들은 초기에는 유교적 교양을 가르치고 과거를 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젊은 향신들은 일본 등지로 유학을 많이 떠나기도 했고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나중에 다시 신식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시민이 없는 공공공간
전통시대 중국의 도시에는 서구와 같은 공공공간인 광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공간, 즉 사묘寺廟와 사당祠堂이 있었다. 사묘寺廟는 불교의 사찰寺과 다양한 신을 모시는 묘廟를 의미한다. 유교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묘회廟會는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거리축제이다.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이 때에 맞게 각자의 행사를 벌이는데, 이들 묘회는 원래 일종의 굿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驅鬼 기능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도교의 굿은 초(醮)라고 불리고, 굿을 비롯한 도교의 의식을 치르는 것을 다쟈오打醮라는 한다. 한국에서도 전통 혼인을 행할 때, 초례를 치른다고 할 때의 초가 이 한자를 사용한다. 굿이 일반인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묘회는 일종의 오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묘회에서는 일정정도 사회적 금기사항도 허용됐다. 유교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성인남녀의 만남이 자연스레 이뤄지기도 했고, 도박도 허용이 됐다. 심지어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원들이 수익을 얻기도 했다.묘회에서는 묘시廟市라는 장터도 열리는데, 베이징의 성황묘城隍廟의 경우에는 매달 세번, 정기적으로 열렸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전통사회의 공공공간은 시민사회를 만들거나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정치적인 역할은 맡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또다른 측면으로 볼 때 중국의 왕조정부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황제의 권력은 현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를 나타낸다. 이는 보통사람들의 생활공간은 고도의 자치성을 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다른 공공공간의 구획범위는 거리街道와 동네 자체이다. 과거 동아시아 사회의 마을은 집집마다 거리로 문이 열려 있어서, 골목조차도 사적인 성격보다는 공공성이 강했다. 중국어로 커뮤니티를 뜻하는 단어는 사구社區인데 여기서 사社라는 글자는 원래 고대에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의미한다. 바꿔말하면 특정한 신을 모시는 지역의 세속적인 신앙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묘는 이런 토지신을 모시는 곳이고, 과거 청두의 토지회는 민간의 커뮤니티 자치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청명절에 함께 모여 묘회를 갖고 토지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는데, 기금을 갹출해서 다양한 공공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함께 길을 정비하고, 하천의 배수구를 청소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름에 하천에서 물난리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공공성을 가진 민간 조직은 이밖에도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인 행회行會,자선 단체인 선당善堂, 그리고 대처에 나와 있는 동향회로서 특히 관료와 상인들이 모이는 회관會館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공적활동을 행했는데 이중에는 구휼을 담당하는 의창義倉이나 고아원 등도 있다.
근대의 상하이에는 이주민들이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와 노동자가 됐는데, 짧은 도시화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이런 지역 자치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상호불신과 약육강식의 세태가 만연했다. 그래서 신중국 설립후 공산당의 주도로 사구마다 거민居民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치와 연대의 문화가 형성되기보다는 상호감시 기능만 강화됐다. 원래 전통적으로도 정부가 주도하는 말단 주민등록과 관리제도는 명나라 때의 이갑里甲제와 청나라 때의 보갑保甲제가 있었는제 전자는 세금과 노역을 징수하기 위한 등록제였고 후자는 역시 국가나 지역 안보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자체가 원래 정부가 부여한 주민들의 상호감시와 연대책임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결사의 역사
이와 달리 순수한 민간자치 조직들은 자경대의 역할을 도맡아 치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자위대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청두에서는 군벌간의 시가전이 벌어진 일이 몇번 있었는데, 이때 자위대가 맞서 싸우며 시민들의 피해를 줄였다. 이 자위대의 중심 세력인 된 사람들이 파오거袍哥라 불리는 비밀결사조직이다. 파오거는 청말의 삼대 비밀결사회당秘密會黨조직의 하나인 거라오회哥老會에 속한다. 여기서 파오는 장삼인데, 이것은 관우가 입던 옷을 의미한다. 중국의 상인과 협객들이 숭상하던 관우가 조조가 내린 호화로운 옷을 거부하고 도원결의후 유비가 준 낡은 장삼을 계속 착용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파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거라오회는 청나라말기 한때 쓰촨성 성인남성의 6~70%가 가담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고 쓰촨성의 기층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했으며 신해혁명에도 가담했다. 특히 주민들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이들을 찾아와서 차관에 앉아 중재와 판결을 요청했다. 중국의 전통왕조와 사회는 주민들의 분쟁을 관에서 송사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다. 청의 순치順治황제가 민간의 규약으로 발표한 성유聖諭중 “화향당이식쟁송和鄉黨以息爭訟”이 이를 의미한다. 순치제는 향약鄉約이라는 지역의 민간관직도 만들었는데 향약은 송나라 때 만들어진 민간의 자치규약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조선에도 영향을 끼친 여씨향약이 그것이다. 마을의 유지와 상인들이 비용을 내서 매월 향약을 초청하고 농민들앞에서 성유를 강의하게 했는데, 이들의 강연내용은 유교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맹모삼천지교나 송나라의 충신 악비의 어머니가 진충보국이라는 문신을 아들의 몸에 새겨넣은 고사이다. 이런 방식으로 왕조정부와 민간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평민들에게 유교사상을 주입했다. 이런 강연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오락성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외에도 차관등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설서說書, 강서講書, 평서評書라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다루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유교윤리와 관련한 것이었다.
비밀결사회당에는 이밖에도 삼합회三合會로 알려진 천지회天地會, 그리고 장강에서 운수업을 하는 수부水夫들이 만든 청방青幫이 있다. 이런 비밀결사회당은 혼란한 시국에 평민들이 연대하여 서로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회색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평민들의 이익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이익단체가 되어 범죄행위를 실천하고 조장하기도 했다. 청방 등은 특히 아편을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뒀는데 상하이의 청방 우두머리로 유명한 두월생杜月笙은 양행이나 군벌, 국민당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과 결탁하여 엄청난 부를 일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쓰촨에서 거라오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수십만에 이르는 상군湘軍의 잔병들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할 수 없었던 청의 조정은 지역의 군대에 의존해야 했는데 후난湖南을 근거지로 했던 중앙관료출신의 증국번曾國藩이 조직한 상군이 이에 호응해서 당시 난징南京에 자리잡고 있던 태평천국을 진압했다. 진압에 성공한 후 증국번은 청의 조정이 자신을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군대를 해산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원래 쓰촨출신의 청년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라오회의 주력이 된다.
비밀결사회당과는 다른 조직은 종교적 성격을 갖는 비밀결사교문이다. 대표적인 세력이 남송에서 시작된 백련교白蓮教도들인데 시초는 불교의 정토종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원래 위진남북조시대에 시작된 불교계열의 비밀결사교문은 남송시대에 백련교를 시작으로 이단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들은 불교나 도교의 교리를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바꿔 세력을 불린다. 미래불인 미륵불을 숭배하여 구세주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설파한다. 사회불만세력을 규합하여 농민기의를 일으켰는데, 이들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고 수많은 평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련교와도 관련이 있는 의화단義和團 사건도 이런 성격을 갖는다. 의화단은 초기부터 서구에서 온 교회세력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유는 이들 종교세력이 있는 사묘를 철거하고 여기에 교회당을 짓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들 비밀결사교문은 무술과도 관련이 많은데, 이들의 수행방법중에는 무술을 통한 신체단련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종교집회와 달리 무술과 관련한 공개행사는 허용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집회를 열 수 있었다. 이들은 신내림을 받으면 총알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양군대와 맞서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비밀결사교문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산둥山東성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산둥성은 무속과 미신행위, 그리고 다양한 이단 종교가 성행했다고 한다.
비밀결사교문은 농민기의와 결합이 되어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교주들이나 그 추종세력의 개인적인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가졌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를 기독교의 메시아라고 주장한 홍슈촨洪秀全이 이끌던 태평천국太平天國운동이다. 1851년부터 10여년간 이들이 멸망하기까지 희생당한 중국인 인구가 7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직전에 중국인구는 4억3천만에 달했는데, 대부분의 가담자들은 빈농이었다고 한다. 즉 청나라 시기에 인구가 두배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농업생산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인구과잉이 초래됐고, 결국 내전으로 귀결한 것이다. 물론 대안으로 이민을 선택한 농민들도 있다. 산둥지역의 농민들이 둥베이로 이주하거나 남방의 농민들이 타이완,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인의 신앙생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종교로는 인도에서 전래한 불교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교가 있다. 이밖에 다양한 민간신앙이 존재하는데 관우를 비롯한 각종 재신과 남방의 해안지역에서 성행한 바다의 여신 마조媽祖, 그리고 집집마다 부뚜막에 사는 조왕신이 대표적이다. 또, 농촌지역에는 마을의 토지신, 그리고 도시를 지키는 성황신이 있다. 중국에는 도시를 지키는 성황신이 한국에서는 농촌마을마다 성황각이나 성황당에 모셔져 있는 것도 문화가 변용되어 전승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한나라에서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지정한 이래 이 전통은 청나라까지 이어졌고, 불교와 도교는 이를 보완하는 민간의 신앙생활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유불도(중국에서는 유석도儒釋道라고 한다.)가 대립하기보다는 함께 조화롭게 공존해왔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신앙을 더하면 중국인들은 특정신을 숭배하고 특정교리에 몰입한다기 보다는 가족과 개인, 혹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모든 신을 모신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실제로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다양한 신들은 같은 장소에 모셔지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힘들지경이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사찰이나 도관의 외부에 민간신앙조직을 만들지 않고 개인들이 이곳을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식으로 개인의 신앙을 유지했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종교는 정치적으로 사회화하지 않았다. 오로지 앞서 이야기한 비밀결사교문들만이 이단의 형태로 반정부세력화 했다. 중국 근대사상가 량슈밍梁漱溟은 중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집단이라고 말했는데, 중국인들의 이런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극도로 경계하고 모든 종교단체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는 것은 이런 전통에 기반한다.
비밀결사교문은 대개 비극적인 역사적 결말을 맺었고 비밀결사회당은 회색지대에 온존했다. 후자는 지금까지도 민간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범죄와 연루돼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층시민들의 삶과 끈끈하게 연계돼 있어, 일정하게 포용돼야 할 필요악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관의 통제 바깥에서 혹은 회색지대에서 작동하던 민간 영역들의 여러 요소들중 소위 비밀결사라는 방법이 민간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주도적 세력의 전통으로 재발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과 민을 중재하는 신사, 향신의 기능은 중국의 민간사회 전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받을만하다.
과거제와 관민신분사회
중국사회는 당송이래 과거에 의해 집권세력이 충원되는 능력주의 전통을 유지해왔고, 명청시대에 실질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일부 극소수의 천민들이 있었지만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계급이었고, 원한다면 3대후에는 계급을 벗어나 면천이 될 수 있었다. 즉 이들에게도 과거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적서차별도 훨씬 적어서, 노비출신이나 평민출신의 첩의 자식도, 재산을 물려받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등사회를 달성한 것이다. 오히려 귀족계급이 존재하던 것은 비한족이 지배층이었던 원나라나 청나라시절이다. 원나라의 경우 몽골족, 색목인, 한족의 순으로 등급이 존재했는데, 명나라가 들어선 후에 잔류한 색목인들은 회족回族이 됐다. 특이하게도 명의 법규에 의해 이들은 자기민족끼리는 통혼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꼭 한족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슬림 신앙과 생활풍속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인종적으로나 언어생활에서는 한족과 동화돼버렸다.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부에 의한 계급차이는 존재할망정 신분상의 차별은 오로지 민과 관의 사이에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관과 민의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관료 후보계급이 바로 사대부, 즉 신사들이다. 이중에서 가장 하층 시험인 현시를 통과하면 생원生員이 됐는데, 이는 지금으로 치면 명문대학에 진학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향시를 통과하면 과인舉人, 중앙고시인 회시를 통과하면 진사進士라고 불렀다. 진사가 되는 것은 중앙의 관료가 될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생원부터는 사인에 속하고 향시를 통과한 이들부터는 신사계급으로 불렸다.
이들 지식인들이 모두 과거에 합격할 수는 없었고,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도 수십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부와 명예를 얻을 수는 없었다. 자손이 삼대이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집안이 몰락하고 평민화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대개 육체노동에 나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생계수단을 구해야 했는데, 교사가 되거나 중앙에서 임명된 관료인 현령을 도와 지방관청에서 막료幕僚와 하급관리인 서리書吏로 일하기도 했다. 현령은 계속 임지를 변경해야 했고, 과거에서 준비하는 지식들은 실제 행정실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 막료와 하급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사법과 재정, 세무 행정에 전문성을 가진 막료들은 매우 좋은 대우를 받았다.
한편으로 원림, 시서화, 차도, 음악, 골동품 수집과 같이 중국의 문인문화가 극도로 우아하고 사치스럽게 발전한 것도 과거제도와 관련이 있다.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지식인들중에 평생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관료가 되는 단조로운 커리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이들이 흥미를 좇고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택한 생활방식이다. 명나라 시기에 중국에 왔던 선교사 마테오리치利瑪竇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퇴폐적인 문화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향신
지역의 지식인이자 신사계급인 향신들은 이와같이 퇴임관료, 교사와 하급행정관리들로서 그들중 지위와 학식이 높은 이들은 현령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권을 부여받았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선 신사계급에서 축출된 뒤에야 처벌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바로 이들 향신이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념인 유교의 도덕적 규범을 현실생활에서 구현하고 전통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역의 민간사회에서 국가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교사와 판관 역할을 한 것이다.쓰촨의 파오거와 같은 사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보다 하층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유교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역 향신중에 거라오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다만 쓰촨은 명나라 말기에 장헌충張獻忠과 같이 청에 맞선 농민군들이 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다보니,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청군에 의해 대량으로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청나라 초기 생존한 쓰촨 전체 인구가 50만에 불과했다고 한다. “후광전사천湖廣填四川”이라는 말은 그래서 남방 타지역의 농민들이 이곳으로 대량으로 이주한 역사를 일컫는다. 그래서 쓰촨지역에는 오래된 대지주나 향신계급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파오거가 자연스럽게 향신계급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파오거가 지주들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작농의 신분으로 경제적으로는 약자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청기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신사는 자연스럽게 상인 계급과 혼종됐는데 다만 왕조정부의 유교적 통치규범인 억강부약 정책하에서는 이들이 대자본으로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격변앞에서 신사계급이 이를 선도하면서 일종의 근대적 지식인, 자본가와 시민계급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내재적 발전시나리오를 갖는 대안역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졘의 경우처럼 20세기초부터 1920~30년대까지 그들이 학교와 기업을 세우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향촌사회에서 행해진 것을 원톄쥔溫鐵軍과 같은 관료출신 정치경제학자는 “향촌건설운동”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군벌들의 할거와 중일전쟁의 발발로 모두 중단이 됐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출신의 지식인 샹뱌오項飆는 그래서 <<주변의 상실>>에서 현대에 맞게 재정의될 수 있는 향신의 역할에 주목한다. 공산당이 이끄는 당국가가 기층영역까지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사회건설과 사회치리治理는 초기 중국 공산당의 군중노선이나 전통중국 사회의 민간자치 수준에 비교해봤을 때도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산당조직은 인구비율로만 따지면 과거의 신사계급과 비슷한 규모인데, 하나의 계급으로서는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또, 말단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중앙의 관료조직과 일체화 돼있어서,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회의 자치와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공산당원인 민간 엘리트들이 어떻게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사회사와 미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또다른 이유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성장서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고도성장시기에 중산층 계급이 탄생하고 집단적으로 부를 일구던 성공의 신화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부유해진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청년들이 경제적 부의 성취와 신분의 상승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이상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성할 수 있는 서사 만들기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실패한 사회일수록 영웅역사관에 심취하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경도된다. 지금과 같이 단극사회에서 다극화된 사회로, 그리고 지역간 경제와 문명의 블록이 재구성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간의 갈등과 무력충돌의 위험도 높아지는데 비뚤어진 민족주의가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성찰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진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 위험성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으며, 샹뱌오가 <<주변의 상실>>에서 “진짜 영웅은 매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발언한 것도 왕디의 책 제목이나 내용과 주의하는 지점이 일맥상통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족: 몇가지 흥미있는 사실들과 추론
1. 홍루몽에서 주인공 집안에서 가장 큰 권력, 경제력을 쥔 사람은 여성이다. 말하자면 대왕대비가 막후에서 가장 큰 실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주인공 집안이 만주족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작가인 조설근도 만주족 출신이다. 만주족 즉, 여진족은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유교의 핵심구조로써 부자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가부장제를 만든 이들이 한족이기 때문에, 전통 한족가정에서는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선왕조가 들어서기전 한반도의 가족권력구조는 과연 어떠했을까? 지금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어쩌면 600년의 질곡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진통인지도 모르겠다.
2. 청말 화베이지역의 농민들의 식생활을 보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주식의 비율이 다르다. 가장 가난한 농민들은 고구마가 주식이고, 그 위는 조, 가장 부유한 농민만이 밀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래서 약혼을 했을 때 신랑이 보내는 선물이 화권, 즉 꽃빵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꽃빵을 받은 신부의 집안은 마을 친족과 이웃들에게 꽃빵을 나눠줬다. 아시다시피 꽃빵은 만토우와 마찬가지로 소는 들어있지 않은 그냥 밀가루찐빵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식은 남쪽은 쌀, 북쪽은 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은 불과 10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도 명나라 시기에 들어왔고, 이 때문에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알려져 있다.
3. 결국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북부에서 가장 유용한 주곡은 수천년간 조와 수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 최초의 농업은 9,000년전 둥베이 북부, 내몽골 남부 지역에서 행해진 기장농업이고 그 뒤를 이어 중원에서도 조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중국 남부에서는 일찍부터 쌀이 주곡이 됐다. 한반도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잡곡이 주곡이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한반도의 농업이 주곡으로서 쌀에 집착하는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4. 이와 같이 조와 기장이 가장 중요한 주곡이었기 때문에, 이를 조리해 먹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죽을 끓여 먹는 것이었다. 지금도 중국 북방인들은 좁쌀죽을 매우 즐겨먹는다. 아침에 특히 많이 먹는데, 묽은 좁쌀죽 (희반이라고 한다)과 함께 밀가루로 된 전병이나 만토우를 함께 먹는다. 좁쌀죽만 먹게 되면 금새 허기가 지기 때문이다. 물론,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가볍게 희반 한그릇을 마시는 것이 더 속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저녁식사를 간단히 하고 싶다면, 같은 방식으로 간단한 요리와 함께 희반을 먹기도 한다. 소화도 잘되고 별 부담이 없다. 좁쌀 희반의 또다른 미덕은 극도로 조리가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좁쌀죽을 거의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도 쌀생산량이 늘면서 가난과 궁핍, 허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조를 멀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5. 중국 남부에서 쌀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시기는 송나라 시절이다. 이때, 베트남에서 들여온 품종이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이 품종은 베트남과 인접한 광시, 광둥이 중심이 되는 화남지역에서 져장성과 장수성이 중심이 되는 화동지역까지 급격히 확산됐고,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동남연안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재배되는 것과는 다른 품종이다.
6. 한국의 동학은 중국의 비밀결사와 비슷한 연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미시사 연구자 백승종은 조선후기부터 유행한 정감록과 미륵신앙 등의 연구를 통해서 이를 밝힌다. 그런데, 중국의 각종 비밀결사도문은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이단의 도구로 사용됐다. JMS를 비롯한 현대 한국의 각종 사교들과 유사하다. 흥미롭게도 드라마 녹두꽃에 등장해서 동학과 맞서는 보부상 상단은 비밀결사회당들과도 비슷하다. 자기 상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패한 정부관료들과도 야합한다. 각종 민간의 비밀결사들이 가진 한계는 조선이나 현대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학은 어떻게 자기편의적인 이단 논리가 아니라 근대적 사상성을 성취하고, 또 모여든 민중을 착취하거나 외부세력을 괴롭히고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꼬뮌을 연상하게하는 실천상의 도덕성도 이뤄냈을까?
7. 백승종의 연구에 의하면 동학의 중심세력이 중인출신 지식인들이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이런 지식인들은 과거를 통해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중국의 하급 사인, 향신과도 비슷한 역할이다. 중국에서는 향신들이 중앙의 관료조직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층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 또 향신들은 상인이 되기도 하고, 상인이 향신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은 과거제도를 악용해서 중앙의 경화사족이 권력을 독점했고, 또 지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양반들과 중인출신 지식인들도 계급적으로 분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들은 지역의 일을 신경쓰지 않고 중앙의 권력동향에만 관심이 있었고, 상인도 될 수 없었다. 즉, 철저한 신분계급사회였고, 평민들과 천민들에 대한 국가와 계급적 착취가 극도로 심한데도, 이들의 정치적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업생산성이 오르지 못하니 잉여생산이 자본화할 수도 없었고, 상거래가 발달하지 못해서 수공업도 발전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난국에서 이런 원시적 경제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
8. 중인지식인들이야말로 평민과 천민의 고통을 동감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혁신하고 싶어한 리더쉽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조선의 왕조사회는 중국대륙의 명청明清과도 달리 그들의 기회를 원천봉쇄했다. 그런데 동학은 그들에게 혁명의 계기를 마련해 줬고,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상과 실천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후기 조선은 주변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전통사회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혁명의 맹아가 더욱 힘찬 기세로 꽃피울 수 있었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