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2년 3월 4일
6. 관념과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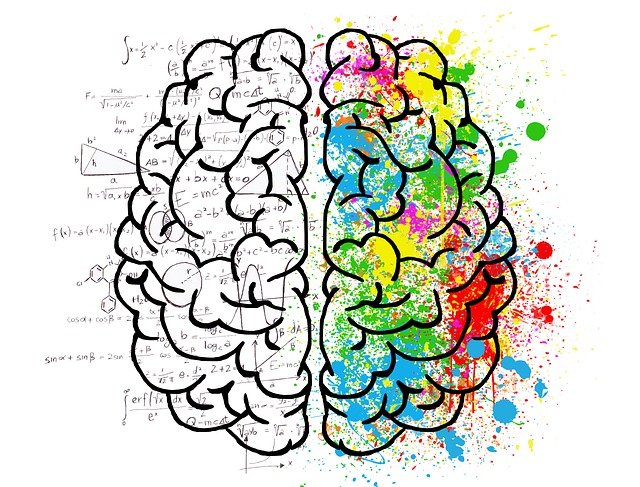
연말에 진행하는 5박 6일간의 ‘애즈원 세미나’에 다녀왔다. 애즈원 네트워크의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이엔즈 스쿨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입문에 해당하는 코스이다. 세미나는 질문과 살핌의 연속이다. 실제와 관념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관념(착각,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에 다가갈 수 있게 되면 실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인간이란 실제에 관심이 닿으면 인간이 가진 본성(행복의 조건)을 살펴 그것을 실현해간다. 코스의 짜임새이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고 있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있나.
세미나를 관통하는 질문이자 다음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다. 간단치가 않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와의 간극을 찬찬히 돌아보는 질문들이 겹겹이 이어진다. 나는 얼마 전, 마트에서 기저귀를 고르는 아내를 기다리다 화가 났던 장면을 떠올렸다. 정아가 기저귀를 고르는 동안 여민이를 안고 기다리는 시간이 못내 지루하고 힘이 들었다. 정아가 빨리 고르지 않아 집에 못 간다고 생각했다. 당시엔 불편했던 감정을 굳이 꺼내진 않았지만 다른 환경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반응이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보고자 했다.
당시에 정아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나.
내 안에서 일어난 것과 실제 일어난 사실을 분리해서 보아 본다. 기저귀를 고른다, 늦게 고른다, 나를 기다리게 한다, 정아 때문에 못간다, 마음이 불편하다, 조급하다 등등 내 안의 상태는 꽤나 복잡하게 전개된다.
반면 실제 정아는 어땠나. 기저귀를 고른다고 가게에 서 있는 정아. 그 뿐이다.
실제 일어난 일을 찬찬히 다시 검토해 본다. 기저귀를 고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구나하고 돌이키게 된다. 정아는 그저 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에 반응해 마음이 울렁했던 것일까. 늦게 고른다거나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고 생각한 정아는 어디에 있는 정아인가. 무엇을 보고 있었나.
관념 속의 정아와 실제의 정아가 분리되니 당시 나에 대해 궁금함이 생긴다. 그때 나는 어땠나. 안고 있던 여민이도 무겁고 기다리기 지루해서 정아랑 빨리 나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기저귀를 고르고 싶어하는 정아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 참았구나. 말하고 싶었던 나를 억누르니 화로 드러나는구나. 마음이 체했었구나.
관계는 아는 사람과만이 나빠질 수 있다 했다. 관계가 나빠지는건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고 돌아봐진다. 만날수록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자기 안에 설정된 기준에 미달되는 상대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마음에 안드는 상대는 어디에 있는 상대인가. 무엇을 보고 있나.
6일간 꽤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몇 년간 공부하는 와중에 약속, 권리, 책임 같은 관념에 대해 고집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어 꽤나 가벼워진 주제들도 보인다. 예전에 이 주제로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떠올라 우습기도 하다. 이번에 관심이 향하는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단 것이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선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화내고, 싸우고, 열등감을 느끼고, 외롭고, 탓하는 마음 상태가 없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싶다. 이런 바탕 위에서 마음 편한 사람들과 함께, 물질도 궁핍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다툼 없이, 자신이 가진 맛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선물경제>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는 하나하나 간단치 않은 주제다. 그런데 이번에 실마리로 다가 온 것이 ‘선물경제’다. 장을 만드는 촉매제이자 그 자체로 실현된 모습이란 생각이다. 순서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자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이 좋을테다.
다음으로 애즈원의 프로세스를 빌리자면, 그간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던 관념상의 요소들을 집중해서 살펴 없애간다. 생각의 관성이 있어 쉽게 기존 습관대로 돌아가게 되니 오랜 시간 집중과 연습이 필요하다. 돈버는 것보다도 우선인, 이것이 1순위인 사람들부터 집중해나간다. 이 공부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관계망 위에서 펼쳐나간다. 여기선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꽤 어렵게 느껴졌다. 내가 뭘해도 내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줄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서 혈연 가족간에도 그런 체험을 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턱하고 막히게 된다.
출발은 어렵지만 각자 공부를 해가며 남을 탓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 그 안에서 생겨나는 애정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테다. 완벽한 개인이 모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개인들이 시작해간다. 선물경제는 그런 장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댓가 없이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텐데 그 마음을 살려 간다. 받았으니 돌려줘야 한다거나 돌려받을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주고 싶은 상대에게 주면 기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 돈은 점점 덜 필요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더 확보해 자기 공부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성숙해진 개인들과 자기 능력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장은 더욱 풍성해진다. 돈에 대한 불안도 줄어든다. 선물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허황된 생각만도 아니다. 우동사에서 몇 년간 펼쳐가고 있는 실험이다. 돈이 없어도 덜 불안한 사람들과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동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 스즈카 커뮤니티에서는 훨씬 큰 규모로 안정감 있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되어가는 곳들을 참고해 간다.
자신을 살피며 다음장을 궁리하는 사이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번 새해는 좀 더 뜻깊다. 40대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정성을 바쳐 만들어보고픈 사회의 밑그림을 구상하는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다.
<죽음>
세미나 끝무렵, 애즈원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자리에 나카이상이 오셨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에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의 어른이다. 이 분 댁에 가면 티비에 늘 한국 사극이 틀어져 있다. 나카이상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죽는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단다. 최근에 지인 둘이 돌아가셨는데 한분은 손주에게 줄 조개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다른 한분은 부인을 찾으러 숲으로 갔다가 돌아가셨단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다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은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냐고, 자신은 그리 생각한단다. 그리고 죽음을 어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도 생각한단다.
나카이상의 이야기에 울림이 있다. 죽음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으면 삶은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깊게 탐구해보고픈 주제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니 여민이는 잠이 들어있다. 정아가 여민이가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려준다. 그리고 여민이는 주변의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 같다 한다. 그렇다면 나로부터는 무엇이 전해지고 있을까. 쌔근쌔근 잠이 든 여민이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다.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정아랑부터 무너지지 않는 친한 관계로 나아가고픈 생각이 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건 정말 큰 행운이다. 상상속 정아가 아닌 눈앞에 있는 정아와 펼쳐갈 나날들이 기대된다.

20대는 돈벌 궁리로 바빴다. 직장생활하며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었으나 실패했다. 대신 돈벌고 싶은 욕구의 바닥에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0대는 친구들과 우동사라는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10년 동안 커뮤니티를 주제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40대에 들어서 다음 10년을 그리고 있다. 볼음도라는 섬을 오가며 농사짓고, 새로운 관계망 실험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환경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