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생명, 생각, 생활, 생산
2022년 9월 30일
8. 기후변화 시대 근대의 종언

출처 : https://ar.pinterest.com/pin/303711568631943617/
심층지구와 표층지구
차크라바르티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성(planet)을 자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globe의 심층에 있는 ‘깊은 지구(deep Earth)’의 현현이자, 깊은 시간(deep time)과 깊은 공간(deep space)과의 만남이다. 이 ‘깊이’야말로 그동안 근대 담론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영역이다. 근대의 시공간은 globe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globe는 인간이 가공할 수 있는 ‘표층 지구(surface Earth)’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심층 지구이고 다른 하나는 표층 지구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를 연구하는 분야를 ‘지구시스템과학(Earth system science)’이라고 한다. 흔히 ‘ESS’로 약칭된다.
많은 지구시스템과학자들에게는 행성 지구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생명을 지탱하는 표층 지구(surface Earth)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내부 지구(inner Earth)이다.
– Tim Lenton, EARTH SYSTEM SCIENCE : A Very Short Introduction, Ch.1 Home, “Defining the Earth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이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심층 지구의 차원을 강조할 때 차크라바르티는 ‘행성’ 또는 ‘지구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반면에 표층 지구는 ‘생물권(biosphere)’이나 ‘임계영역(critical zone)’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다. 인간이 이동가능하고 거주가능한 지표면의 얇은 막을 가리킨다. 한편 러브록이나 라투르의 가이아(Gaia) 개념은 심층지구와 표층지구를 아우르고 있다. 라투르가 “가이아는 임계영역을 말한다”고 할 때에는 표층지구의 측면을 가리키고, 러브록이 “가이아의 복수”를 말할 때에는 심층지구의 활동을 말한다.
지구시스템과학의 탄생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행성, 즉 지구시스템에 대한 탐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산물이다. 이 점 또한 “글로브가 플래닛을 드러낸다(The Global Reveals the Planetary)”고 하는 차크라바르티의 테제와 부합되고 있다.
지구시스템과학 자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정치의 산물이자 (…) 냉전과 군산(軍産) 경쟁의 산물이다. (…) 행성적인 것을 우리 의식에 들어오게 한 것은 냉전시대와 그에 따른 ‘대기(大氣)와 우주의 무장화’의 산물인 우주탐사기술이었다. 깊은 지구를 탐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 : 만약에 미국의 방위 체제와 그보다 더 비난받는 석유와 광산 회사들이 땅을 파는 채굴 기술을 그토록 개발하지 않았다면, 기후과학자들은 80만년 된 얼음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Matter of Spiritual Concern?”
https://bulletin.hds.harvard.edu/the-planet-an-emergent-matter-of-spiritual-concern/
차크라바르티의 분석을 참고하면, 근대의 과학기술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인류에게 심층지구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심층지구의 탐험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의 초래에 의해서다. 근대주의자들은 전자를 ‘인류의 진보’라고 찬양하였고, 토마스 베리 같은 생태주의자들은 후자를 ‘지구의 퇴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제야 인간의 진보가 자연을 황폐화시키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지구의 ‘퇴보’가 인간의 ‘진보’를 위한 조건이었던 셈이다.
– 토마스 베리 지음, 이영숙 옮김, 『위대한 과업』,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92쪽
인간이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표층지구의 자원을 채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표층지구 안에 감춰져 있던 심층지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마치 우리가 부상으로 피부가 벗겨지면 그 안에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부려먹으면 부려먹을수록 우리는 행성과 더 많이 만나게 된다(The harder we work the earth, the more we encounter the planet).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3.
https://monoskop.org/images/9/94/Chakrabarty_Dipesh_2019_The_Planet_An_Emergent_Humanist_Category.pdf
“우리가 지구를 일하게 한다(We work the earth)”는 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칼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노동자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인류는 행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것이 ‘근대의 역설’이다. 이 역설은 종래의 근대 담론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 인식에 의해 비로소 이 드러난 것이다. 그 장본인이 차크라바르티이다.
행성의 역사성
지구시스템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종래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대단히 인간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령 지구시스템과학에서 시간의 스케일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다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인간 차원에서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구시스템과학은 행성 차원에서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구시스템과학은 (…) 인간을 (다양하게 독립적인) 세 가지 역사들(three histories)의 접점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인간에게 매우 장대하고 다층적인 그리고 이질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진 과거(past)를 제공한다. 그 세 가지 역사들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매우 다른 [세 가지] 시간 스케일로 정의된다:
① 행성의 역사(the history of the planet)
② 행성의 생물의 역사(the history of life on the planet)
③ 글로브의 역사(the history of globe made by logics of empires, capital, and technology)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1.
이에 의하면 지구 행성에는 세 가지 차원의 역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것은 ①행성사와 ②생물사와 ③인간사이다. 이 중에서 행성사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생물사,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인간사이다. 기나긴 행성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은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한 시기 구분은 프랑스의 사변적 실재론자 퀭텡 메이야수(1967~)가 시도한 적이 있다. 그는 2006년에 쓴 『유한성의 이후』에서 우주의 탄생에서 인간의 출현에 이르는 역사를 네 단계로 나누었다.
우주의 기원 (135억년 전)
지구의 형성 (44억 6천만년 전)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 (35억년 전)
인간의 기원 (200만년 전)
– 퀭텡 메이야수 지음, 정지은 옮김, 『유한성 이후: 우연성의 필연성에 관한 시론』, 도서출판 b, 2010, 25쪽.
여기에서 “지구의 형성”은 행성의 역사에 상응하고,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은 행성의 생물의 역사에 대응되며, “인간의 기원”은 글로브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특히 “제국(empire), 자본(capital), 기술(technology)”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시대를 차크라바르티는 “글로브의 역사”라고 부른다(the history of globe made by logics of empires, capital, and technology).
종래에 인류가 역사를 말할 때에는 인간의 기원이나 글로브의 역사에 한정시켜 왔다. 그러나 인류세는 행성사와 생물사도 역사학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영역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행성과 조우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면서 그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그 어떤 것과 조우하는 것이다.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4.
따라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역사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차크라바르티가 제안하는 ‘인류세 역사학’이다. 그것은 세계사(world history)도 아니고 지구사(global history)도 아닌 행성사(planetary history)이다. 행성사라는 거시적인 지평에서 인간사(human history)를 다시 조망하자는 것이다. 세계사와 지구사가 인간과 관련된 역사를 탐구했다면, 행성사는 인간과 무관한 역사까지도 시야에 넣는 역사관이다. 아마도 차크라바르티는 인류세의 곤경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인간 밖에서 인간을 다시 보는 것이다.
행성의 선조성
위의 역사 단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성은 인간 이전에,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여 왔다. 이것을 메이야수는 행성의 ‘선조성’이라고 부른다.
인간 사유의 출현, 심지어는 생명의 출현에 앞서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계와 관계맺는 모든 형태에 앞서서 제시된 세계. (…)
나는 인류의 출현에 앞서는, 심지어는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생명에 앞서는 모든 실재를 ‘선조적(ancestral)’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Quentin Meillassoux, After Finitude: An Essay on the Necessity of Contingency translated by Ray Brassier, Continuum, 2010, pp.9-10; 퀭텡 메이야수, 『유한성 이후』, 26-27쪽.
여기에서 ‘ancestral’이라는 단어가 흥미롭다. 종래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메이야수는 인간 출현 이전의 모든 존재를 ‘조상적’ 또는 ‘선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해월 최시형이 천지(天地)를 인간과 만물의 부모라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 지구학적으로 말하면 “행성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조상이자 참된 부모”라는 것이다.
행성의 거주성
해월은 보다 구체적으로 천지를 부모의 포태(胞胎)에 비유하였다. 여기서 ‘포태’는 만물을 생성하고 길러주는 어머니의 ‘품’을 상징한다. 산모가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듯이, 천지도 만물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시스템과학으로 말하면, 이것은 ‘거주성(habitability)’ 개념에 해당한다. 지구시스템과학은 “지구는 어떻게 생물을 살 수 있게 하였는가?”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생존 조건 내지는 거주 조건을 연구한다.
가령 1964년에 나온 스테픈 돌(Stephen Dole)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들(Habitable Planets for Man)』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왜 다른 행성에는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가? (…) 우리의 태양계에는 거주가능한 행성들(habitable planets)을 찾을 수 있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 Stephen Dole, Habitable Planets for Man, RAND Corporation, p.5.
이 책은 기본적으로 ‘행성학(planetology)’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의 거주가능 조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구시스템과학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온도(temperature)’이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불안해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그리고 빛, 중력, 대기, 물 등이 이어지고 있다(Ch.2 “Human Requirements”).
그리고 이 책의 8장의 제목은 “지구에 대한 감사(An Appreciation of the Earth)”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 조건들이 조금만 달라졌더라면 인간은 지구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기후변화는 저 조건들 중에서 맨 첫 번째 조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거주가능성
차크라바르티는 이와 같은 과학적 성과에서 통찰을 얻어 ‘거주가능성(sustainability)’과 ‘지속가능성(habitability)’을 대비시킨다. 이 대비는 그의 「행성」 논문에서 두 번째 백미라고 할 수 있다(첫 번째는 ‘글로브’와 ‘행성’의 대비).
글로벌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의 차이는 글로브와 플래닛의 사고 양식에 중심이 되는 두 개의 관념을 대비시킴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지속가능성과 거주가능성이다.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17-18.
즉 거주가능성은 행성의 영역이고, 지속가능성은 글로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지속가능’ 뒤에 ‘발전(develoment)’이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으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나 근대 체제와 같은 기존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이다. 따라서 글로브에 속하고, 유럽중심적이며, 인간중심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 대해서 차크라바르티는, 폴 와드(Paul Warde)의 『지속가능성의 발명(The Invention of Sustainability)』이나 스태픈 모스(Stephen Morse)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선행연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그것의 발전을 유럽 확장 시절의 농경 경험에 빚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단연코 글로벌의 역사에 속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널리 사용된 정의는 (1983년의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인간중심적 관념은 20세기를 지배하였고, 그 이후에도 ‘녹색 자본주의’라는 주문(mantra)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이 인간중심적 개념은, 과학적인 산림 경영의 역사에서 가져온, “지속가능한 최대 수확” 관념이 패권을 차지하게 된 20세기 초에 “어부 경영” 관련 문헌에서 극단에 달했다.
모스가 정확하게 주장하듯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그것은 “인간중심적 개념”이고 (…) “인간과 환경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p.18~20.
이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개념은, 가령 ‘과학 농업’과 같이, 주어진 자원과 환경 안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고안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개발에 대해 “지구가 과연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다. 또는 주어진 화석 연료를 인류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의도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개념이다. 이것이 차크라바르티의 주장이다.
글로벌 시대의 종언
반면에 지속가능성과 대비되는 ‘거주가능성’은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이외의 생명들의 생존 조건을 묻기 때문이다.
인간은 거주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중심적이지 않다. 하지만 거주가능성은 인간 존재에 중심적이다. 만약에 복합 생물이 거주하기에 행성(=지구)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기 중의 산소의 양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산소는 아주 오랫동안 21%를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21.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산소는 지속가능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가능의 차원이다. 이것을 차크라바르티는 지구과학시스템의 개념을 빌려서 ‘거주가능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후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후가 갑자기 치솟으면 살아남을 생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세 시대의 기후 위기는 지속가능의 위기에 앞서 거주가능, 생존가능의 위기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지구의 거주가능성 문제가 더해진 형국이다. 그래서 그는 “글로벌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글로벌인 것과 행성적인 것이 만나는 접점에 살고 있다. 글로벌만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the global as such is over).
– Dipesh Chakrabarty, “The Planet: An Emergent Humanist Category”, p.23.
‘글로벌 독존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근대의 종언’을 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글로브에 플래닛이 겹쳐진 인류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다.
근대적 시공관의 전복
흥미롭게도 지구의 거주가능성 문제를 선구적으로 탐구한 인물은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이다. 그는 처음에 화성과 금성의 대기를 연구하다가 “왜 지구에만 생물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지구의 대기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74년에 이 책(=『가이아』)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지구가 화성이나 금성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정도였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생물들이 거주하기에(inhabit) 적합하도록 항상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구가 갖는 이런 속성이 태양계 내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생활하는 생명체들 덕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 James Lovelock,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2000(1979), Oxford University Press, “Introductory”, p.9.
러브록에 의하면 지구의 거주 조건은 지구에 사는 존재들의 협업의 산물이다. 그것은 바위, 바다, 나무, 미생물 등이 자신들의 거주 환경을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 간 결과이다. 러브록의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브뤼노 라투르는 근대적 시공간 개념을 전복시킨다.
만약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기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사물(res extensa)’이 있어서 모든 생물이 그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기후는 상호작용들의 역사적 결과이다. 그것은 생명체들과 함께 확산되고 축소되며 죽어간다.
–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f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Polity Press, 2017, p.106.
라투르에 의하면 만물은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와서 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정반대로 자신들이 거주할 공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라투르는 “공간은 시간의 자손이다(Space is the offspring of time)”고까지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물의 거주 공간이 형성되어 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후와 생명이 함께 진화했다고 한다면, 공간은 틀이 아니고 맥락도 아니다: 공간은 시간의 자손이다. 갈릴레오가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과 정반대이다. 갈릴레오는 공간 속에 각각의 행위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모든 것으로 확장시켰다. 러브록이 보기에 그런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즉 임계영역은 우리가 함께 공모하는 공간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만큼 펼쳐진다. 우리를 숨 쉬게 해주는 존재들이 지속되는 한 우리도 지속된다. (위와 같은)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적 시공간 개념이 깨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절대적 공간 안에 사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의 생활자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의 구성원들이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차크라바르티가 글로브에 대한 행성 개념을 가지고 근대의 종언을 알렸다면, 라투르는 러브록의 가이아 개념을 가지고 근대를 전복시키고 있다.
(이 절의 내용은 조성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 라투르의 가이아학과 동아시아사상>, 《다시개벽》 7호, 2022년 여름호 참조)
기후를 생성하는 인간
그런데 동아시아적 세계관에서 생각해 보면, 지구상의 행위자들은 공간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학적 존재론에서 따르면 사물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기후는 분위기의 일종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구 근대의 존재론과 동아시아 기학적 존재론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근대 철학을 열었다고 하는 데카르트는 좌표축을 발명하고, 그것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시하였다. 즉 가로축에는 시간을, 세로축에는 거리를 표시하고, 매 순간 위치를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물의 운동 이외의 요소는 제외되게 된다. 시간과 거리로 표시된 운동 이외의 속성은 표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숫자로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사물과 기를 주고 받는다. 최시형은 먹는 행위를 ‘기화(氣化)’, 즉 기의 교환과 변화라고 하였다. 기(氣)는 라투르나 제인 베넷의 개념으로 말하면 ‘행위성’에 상응한다. 행위에 의해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러브록의 가이아론에서는 만물이 각자의 행위에 의해 산소나 기후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인류세 시대에는 인간의 산업활동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성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 활동은 데카르트의 좌표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근대적 인간관의 맹점이 있다. 인간과 만물이 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그 기(氣)가 글로벌 시대에는 ‘기후’로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은 행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기학적 존재론과 인간관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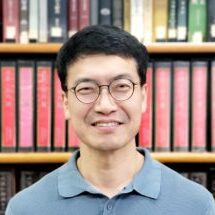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다시개벽' 편집인. 지구지역학 연구자. 서강대와 와세다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였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한국 근대의 탄생'과 '개벽파선언'(이병한과 공저), '하늘을 그리는 사람들'을 저술하였다. 20∼30대에는 노장사상에 끌려 중국철학을 공부하였고, 40대부터는 한국학에 눈을 떠 동학과 개벽사상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1990년대부터 서양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지구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근대성’이다. 그것도 서구적 근대성이 아닌 비서구적 근대성이다. 동학과 개벽은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고, 지구인문학은 ‘근대성에서 지구성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양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구지역학’을 사용하고 있다. 동학이라는 한국학은 좁게는 지역학, 넓게는 지구학이라는 두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차 개화학과 개벽학이 어우러진 한국 근대사상사를 재구성하고, 토착적 근대와 지구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총서를 기획할 계획이다.